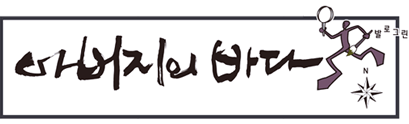
이중섭 <제주도 풍경>
강홍림 글 · 사진
-

“하하, 우리 아들이에요.”
묻지도 않았는데 자랑스럽게 먼저 말을 건넨다.
“아빠를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게 발 씻어드리는 것 말고는 없더라구요. 어제 가족들이 하루 종일 걸었거든요.”
아들이 멋쩍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보아하니 우리처럼 여행 오신 것 같은데 보셨을까? 조금 전 우리는 영웅을 만났지요. 우리 시대의 영웅 말이죠!”
“상남자! 가장의 본보기에요!…….”
부자는 이중섭에게서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함께 온 부인과 딸은 재래시장으로 가고, 고달팠던 영웅의 흔적을 더 느껴보려 둘만 자구리 바다에 왔다고 했다. 이중섭은 가족을 먹여 살리려 이 바다에서 게를 잡았다고 한다. 게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작품에 게가 자주 등장한다고 했다. 남자로서 가장으로 이중섭을 자신들의 영웅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아버지 또래처럼 보이는 남자는 자신 또한 의무를 다한 가장처럼 당당해 보였다.
-

“모든 아버지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아들의 말을 끊은 것이다.
“젊은이 아버지도 알고 보면 다 훌륭한…”
“아닙니다!”
남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가로막았다.
“저희 아버지는… 그런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술과 친구 좋아하고 가정을 내팽개친 사람입니다.”
“이보시게, 아버지가 왜 술과 친구 좋아하셨는지, 그 까닭은 생각해 보았는가?”
“아버지는 그냥 그런 것들이 좋으신 겁니다!”
“음… 정말 그럴까?…, 아버지 연배가 어떻게 되시지?”
“오십 팔 년생이십니다.”
“이런!~ 나와 동갑이시네. 올해 환갑이고!”
남자는 친구를 만난 듯이 말을 이어갔다.
-

“굶주려 배고팠던 유년시절, 매일 최루탄이 터지고 속보가 줄 잇던 혼란스러운 시기에 청년 시절을 보내고, 앞만 보며 달려왔더니 벌써 육십이라네. 자네는, 자네 아버지의 삶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던가? 아버지가 마시는 술은 매일 매일의 눈물이고, 담배 연기는 아쉬움의 한숨이라네.”
“십 분쯤 가면 영웅의 흔적을 볼 수 있을 걸세. 자네에게도 영웅일 거라 확신하네! 영웅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길 바라네.”
공손하게 인사하고 자리를 떴다. 조금 걷다 돌아보니 부자는 손을 흔들고 있다.
-

장인 회사에 대한 생각은 온데간데없이 파도에 쓸려갔다. 낯선 남자에게서 어렴풋이 들은 이야기였지만 이중섭에 대한 생각이 계속 맴돈다. 조그마한 공원에는 이중섭을 기념하기 위한 여러 조형물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아! <제주도 풍경> 이 작품이 자구리 바다를 담아놓았구나! 게와 두 아들을 바라보는 부부의 눈빛, 서귀포 바다의 섶섬과 문섬이 사이좋게 마주 보며 게거품 문 게들을 환영하듯 어우러져 있다. 수염 깎지 않은 아비의 눈빛에 눈물이 아른거렸다. 눈빛에 담긴 진심에서 나는 마침내 아버지를 보았다. 이중섭을 영웅이라고 불렀지만 아버지는 결코 영웅이 아니다. 그런데도 왜 그의 눈에서 아버지가 보인 것일까?
초등학교를 지날 무렵 아버지가 다시 떠오른다. 6학년 때, 아버지가 면담을 위해 학교로 왔던 날이 떠올랐다. 같은 반 친구와 심하게 다퉈 아버지가 오신 것이다. 그래도 나는 아버지가 부끄럽고 못마땅했다. 학교에 아버지가 찾아온 친구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아버지가 더 부끄럽지 않았을까?
여기저기 거리의 담벼락에 이중섭의 작품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다. 난민 이중섭! 어떤 마음이었을까? 언젠가 돌아가리란 희망의 끈을 갖고 있었을까? 피난민 이중섭이 거주했다는 초가 골방에 호기심으로 들어서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축축이 젖은 땅을 딛고 서서 팔다리를 쭉 뻗기도 어려운 이 공간에 네 식구가 살았다는 생각을 하니, 자꾸만 필요 이상으로 아파트를 넓혀 가던 내 욕망이 부끄러웠다. 비나 간신히 피할 정도였던 초가 골방과 내가 사는 아파트가 겹쳐 보인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손을 붙들고 무릎을 꿇었다. 아들에게 자전거를 사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 때문에, 너무나 보고 싶은 마사코를 그리워하며…. 중섭은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식음을 전폐하며 거식증으로 혼미해가는 상황에서도 가족을 그리며 눈물을 흘렸다. 아내와 아이들이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았다. 그렇게 서서히 천재 화가의 삶은 저물어가고 있었다.’
-

“가족을 목숨처럼 사랑한 작가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중섭 작품에 대한 한마디에 울림이 있었다. 안내하는 분의 이야기를 엿들으며 여전히 나는 초가 골방 근처를 서성이고 있다. 나의 추한 모습과 탐욕이 이 공간에 고스란히 비추어졌다. 아파트의 넓이가, 가격이 행복을 담보하지는 않을 텐데…. 너무도 부끄러웠다. 뿌리치고 도망가도 될 텐데 왜 나는 추한 모습에 머무르고 있는 것일까? 알 수 없는 기시감이 느껴져 아찔하다. 여기서 얼마나 서성거렸을까? 다시 아버지가 떠오른다. 이중섭과 아버지는 분명 다를 텐데 말이다. ‘아!~ 어쩌면 아버지도 이중섭이었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느낌이 휙 지나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