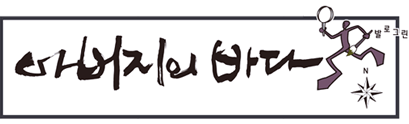
이중섭 <제주도 풍경>
강홍림 글 · 사진
-

어머니와 누나는 늘 가까이 있었다. 마치 자매처럼 친구처럼. 그렇다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해본 적도 없었다. 친구들은 아버지와 가끔 술도 마신다는데. 맞술은커녕 대화도 없었다.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하숙생과도 같았다. 어쩌다 일찍 퇴근하셔도 현관에 나가는 식구는 없었다. 아버지가 술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도 하다. 아버지께 그 흔한 생일선물조차 드려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와 나 각자의 인생이라 생각했다.
동네 골목을 벗어나 강 같은 계곡을 마주했다. 뒤엉켰던 생각들이 시원함에 씻기는 듯하다. 주차장에 들어서니 여행객들로 붐볐다. 평일 대부분 가족여행이다. 사랑스러운 표정의 가족여행객들은 가가호호 웃음이 가득하다. 사람들의 웃음에 아버지의 웃는 모습이 떠오른다. 어느 샌가 볼 수 없게 된 아버지의 웃음이 문득 그리워졌다. 누가 아버지에게서 웃음을 앗아갔을까?
떠들며 걷는 사람, 왁자지껄 시끄러운 여행, 조용한 여행, 말없이 걷는 사람…. 나는 어떤 모습의 여행을 하고 있을까? 가족 여행객들을 보니 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바뀌었다. 집에 걸린 여행사진에 아버지 모습이 없는 것 같았다. 그 사진을 더듬으며 간혹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가족여행이 남 일 같지 않아 서글퍼졌다.
-

생각해 보니, 아버지는 내 요구에 망설여 본 적이 없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사달라고 했던 것, 하고 싶다는 것, 가보고 싶다는 것…. 안 된다며 막아선 것이 없다. 금 나와라 뚝딱 요술방망이처럼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자로 생각했던 것 같다. 사실 아버지는 없는 살림에도 여기저기 구하고 구해서 들어주신 것이다. 나는 참 못된 아들이었다.
내가 태어나서 결혼할 때까지 아버지는 묵묵히 뒷바라지만 해오셨다. 내가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 단 하나도 거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지원해 주셨다. 그런 아버지셨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는 육십 너머의 삶에 대해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셨다. 자구리 바다에서 만났던 분의 이야기가 맴돈다.
‘자네 30년을 뒤치다꺼리했지만, 앞으로 아버지 30년은 누가 돌봐줄 건가?’
‘누가 그렇게 살라 했냐고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조건 없는 헌신이라네.’
-

서귀포항을 바라보며 섰다! 아버지 모습이 보인다. 배에 부딪히는 파도에 아버지의 술잔 소리도 들린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받아주시는 아버지! 선착장 계선주처럼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는 그렇게 나를 기다리고 계시리라. 아무도 칭찬해 주지도, 사랑으로 안아 주지도 못했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그 긴긴밤을 술로 마음을 흘리며 보내셨으리라. 아버지의 들리지 않는 비명에 갈매기가 꺼이꺼이 울고 있다.
놀이동산을 방문하면 내 뒤를 쫄쫄 따라다니던 은수의 모습이 떠오른다. 겨울도 봄처럼 환하게 하는 그 미소로 ‘아빠’하면서 따라다니는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니, 내가 집착하는 물질과 성공적인 삶이 의미 없게 느껴졌다. ‘그래, 저거면 된다! 나는 저 미소를 지킬 수만 있다면 무슨 삶에 처해도 족하다.’ 그 미소에 실린 눈물이 자욱하게 번져, 나는 오늘도 걸어갈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정방폭포, 서복전시관, 소남머리, 자구리바다, 천지연, 서귀포항…. 빼어난 절경들이 모여 있는 서귀포! 그 경관에 어린 이야기들은 더욱 감동적이었다. 관광객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이야기였는지 모른다. 내게도 어느새 이중섭은 영웅이 되고 있었다. 단지 화가로만 알았던 이중섭! 가장으로 치열하게 살았던 한 남자를 알게 된 것도,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 것도 가슴 벅차다. 서귀포의 모습은 아버지였다.
다리를 건넜다. 새로운 세상과 연결하는 새연교라 했다. 그렇다! 아버지와 새롭게 연결되어야 한다. 서쪽을 향하는 의미도 있었다. 서쪽으로 돌아 내가 갈 곳은 새로운 직장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다. 조만간 아버지와 단둘이서 이곳을 찾아야겠다. 아버지 발을 씻어드려야겠다. 西歸浦! 아버지의 바다였다.
|